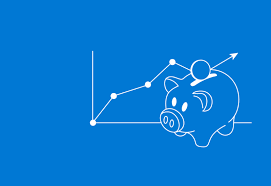가난한 경제학자의 변명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할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주식이 수익률이 높을까? 한참을 고민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신들의 질문에 항상 교과서 같은 답만 한다면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핀잔을 듣기 일쑤다. 사실 학자의 관심은 자명해 보이는 논리를 어떻게 증명하는 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민첩하게 판단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느껴진다. 학자들은 아무도 단정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어떻게 현재 상황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왜 그런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 지를 설명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은 복리이자율이라고 이야기 했다. 지수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시장이론에서 수요, 공급곡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다들 잘 알고 그 흐름에 맞게 현명하게 판단을 내린다.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합리성을 이렇게 방증하고 있는 것 같다. 며칠전 재미있는 논문을 읽고 생각이 나서 감상을 적어보았다.
지적능력은 금융소득과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과연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적능력이 더 많은 경제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없었다. 위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능력과 경제지식 그리고 지적능력과 금융이해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요점을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능력이 경제지식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지적능력이 금융이해력과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셋째, 경제지식과 금융이해력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들은 영국인을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지적능력은 경제지식의 습득에 0.37에서 0.52까지의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나 경제학 수강여부 등의 변수를 통제하여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변수들의 관계는 지적능력과 경제지식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적은 값을 보였다. 이 결과는 보편적 지적능력이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제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