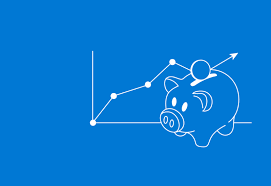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단계별 경제정책
경제가 위기 상태에 맞이하면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극복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물론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 뉴케인지언 학파 간의 열띤 토론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모두가 동의할 단계적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해결책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노동의 유효수요가 낮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경제성장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오쿤의 법칙과 같다. 그럼 이 경우 어떤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가?
- 첫째, 우리는 위기가 아닐 때부터 위기를 준비한다. 불황일 때 원만하게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불황이 시작될 시점의 부채는 크지 않을수록 좋다.
최근 정부의 관리재정수지의 목표를 보면 GDP 대비 3% 수준으로 보이는 데, 막상 기획재정부에서는 2%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G20에서 독일과 견줄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정적 재정 상태는 불황 또는 경제의 일본화(Japanization)이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 둘째, 위기가 닥치면 통화정책을 먼저 실행한다. 이자율 인하는 신속하며, 경제 회복되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되면 되돌리기도 용이한 편이다. 더욱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에 목표를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독립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 그 특성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통화정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뉴노멀로 불리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 성장률의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통한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유동성함정’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어 통화정책은 생각보다 그 유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 셋째, 불황이 장기화되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위기에 대비해 준비해 놓았던 재정정책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시작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기회복 후에야 실행되는 경우 경제적 효과 없이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MIT 교수, 올리버 블랑샤의 주장처럼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이자율보다 명목 GDP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 정부의 재정 적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2019년 한국 방문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권고한 바 있다.
-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들이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신뢰 부족으로 의심이 커지면 투자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미래에 발생할 증세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