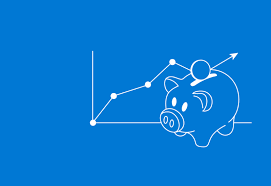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양상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학 원론에서도 배우는 GDP Deflator, CPI, PPI 등의 지수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유일한 물가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황과 용도에 맞게 몇 가지 유용한 물가지수 중에서 선택하여 분석해야 한다. Financil Times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과 유럽의 매파들은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근원 물가지수는 간단히 말하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 보통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을 의미한다. - 에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지수이다. 그러나 가계는 근원 물가 수준이 아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근원 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근원 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근원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히려 근원 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주로 과도한 명목국내총생산(NGDP) 성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보다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진실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모호하게 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위의 두 가지 주장을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자. 이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생활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유가의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면 전반적인 거시 경제는 더 안정될 것이고 결국 가계도 나아지게 될 것이다.
임금 상승도 마찬가지로 해석 될 수 있다. 분명히, 대중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낮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선호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는 경우 다른 변수들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명목임금을 올리려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도 동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Financial Times 기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생산성이 높은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로 인한 임금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해로운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높은 생산성은 그 자체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확실히 중앙은행들의 말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본위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중앙은행은 노동계급에 대한 분배 싸움에서 항상 자본의 편을 든다는 점에서 더 나쁜 것으로 비난 받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판자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임금 인상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다면 노동자들에게 더 좋다. 그러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명목임금 인상은 적어도 장기적으로 대중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에 신경을 쓴다.
2004년 이후 생산성은 아주 느린 속도로 증가했고, 이 추세가 가까운 미래에 바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빠른 명목임금 상승을 유도하려는 통화정책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려 할 때, 경제가 불황에 빠질 위험이 발생한다.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애초에 과도한 부양책을 피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