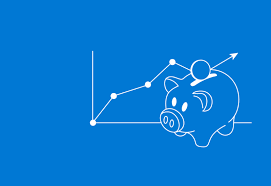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한 회상
최근 20세기 마지막 25년 동안을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해 회고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현재에는 아주 명백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확실해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 “남한의 시장 경제 모형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영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항공 운임료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된다. 소득 세율이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주장들을 보자.
이러한 주장들은 현재의 시각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들로 받아 들일 수 있지만 1973년 기준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1967년 CIA 리포트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난지 1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북한이 남한보다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의 투자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98%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45년에서 75년 사이를 “Les Trente Glorieuses”라고 일컬으며 3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기억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심지어 소련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이 당시 경제를 회고해 보면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확산과 발 맞추어 많은 국가들이 좀더 국가의 통제력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 1929년부터 1973년까지의 이런 큰 정부에 대한 유행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며 널리 퍼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하며 유권자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동아시아의 호랑이들이었다. 70년대 중분에서 80년대 중반까지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카포르가 실물GDP의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며 발전하였다. 그 이전에 서구를 제외한 유일한 성공적인 경제를 가졌다고 평가받은 일본은 그 지위를 잃었다. 점점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형을 연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수입대체 모형에 비해 우월하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오늘날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국가주도적 경제정책때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모형에 비교 평가해 봐야 할 것은 홍콩의 자유방임적인 모형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모형이라 한다면, 자유방임과 국가주도 경제 모형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신자유주의 물결을 불러 일으킨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낮은 세율을 바탕으로 1975년에서 85년 사이에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 유권자들은 삶의 질이 정체하게되면서 점점 고세율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커졌다.
- 무역이나 금융 부문의 규제들이 눈에띄게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뒤처지게 되고 심지어는 1인당 GDP 기준 25% 수준이하로 떨어졌다. 유럽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은 점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공산주의 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했다.
한번 신자유주의 물결이 시작되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는 자유화 이후에 나아졌다. 신자유주의하면 종종 로널드 레이건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신자유주의 물결은 미국 밖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필리스 곡선의 이동이나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중요성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내용과는 다른 주제에 대한 성공적인 예측을 통해 그의 명성을 얻었지만, 실제로 좌파쪽에서는 통화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를 혼용하기도 한다.
경제개혁이란 말의 뜻도 변했다. 70년대 이전에는 정부의 역할이 증가함을 의미했고, 그 이후에는 정부 역할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70년대 특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국가주도 경제를 혼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브래드 드롱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2010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몇몇은 주택규제나 특정 직업에 대한 면허제도, 환경규제 등의 정책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며 그의 평가에 대해 너무 섣부르다고 주장한다. 항상 그렇지만 철학적 사조에 대한 그림은 너무 복잡하다.
참고문헌: Was there really a “neoliberal turn”? by Noah Smith Thoughts on the neoliberal wave by Scott Sum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