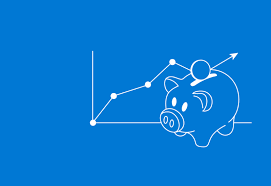조세제도
조세의 효율성
정부는 국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조세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조세제도는 어느 쪽에 세금을 부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세금 징수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에서 보았듯이, 개별 경제 주체의 유인이 왜곡된다. 이런 왜곡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감소분이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소득과 소비, 어느쪽에 과세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부 세입의 대부분은 소득세에서 나온다. 그러나 소득세는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소비세의 경우, 근로의욕과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왜곡이 적다는 것은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소비세의 경우 역진적인 경향이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소득세의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것이고,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소득 증가액에 대한 세금 증가액의 비율을 뜻한다.
에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까지는 세율 10%이고, 5,00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를 과세 한다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1,500만원 (0.10 x 50,000,000 + 0.20 x 50,000,000 = 15,000,000)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 평균세율은 15%, 한계세율은 20% 이다.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그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0.2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세율은 세금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희생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고 한계세율은 조세왜곡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액세
정액세(lump-sum tax)는 소득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내는 세금을 말한다. 정액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없어서, 한계세율은 0%이고, 이런 이유로 경제적 유인을 주는 조세왜곡이 가장 적은 조세이다. 그러나 5,000만원의 소득자도 1억원의 소득자도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평균세율은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낮아지는 역진적인 현상을 보이며,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조세의 공평성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두가지 원칙
편익원칙
편익원칙(benefits principle)이란 세금 부담이 그 세금을 통해 발생하게 될 편익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편익원칙은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이 사적재화와 비슷해지는 효과를 가져다 주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능력원칙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란 세금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원칙은 다시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과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원칙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세금도 비슷하게 내야한다는 원칙이다.
-
수직적 공평성을 기초로 세금을 비례세(propotional tax), 역진세(regressive tax), 누진세(progressive tax)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수평적 공평성을 기초로 세금을 부과할 때 특히 부담 능력에 대한 판정의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두 가구의 소득이 6,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자녀의 유무, 부채, 노동소득, 자본소득의 구성 등 가정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소득만으로 세금 부담 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결론
세제의 중요한 목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지만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공평성이 떨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충돌은 바로 이 두 목표에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